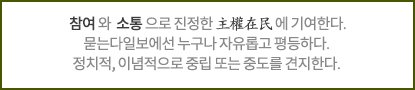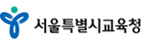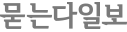배재탁칼럼 | 마르고 닳도록 하던 국민의례
22-11-04 09:37페이지 정보
좋아요 1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16관련링크
본문
마르고 닳도록 하던 국민의례
요즘도 프로야구를 시작할 땐 국민의례를 한다.
한국시리즈나 올스타전 같은 특별한 경기도 아니고, 모든 경기에서까지 국민의례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하다.
(논의는 별도로 하고 ‘라떼’ 얘기로 넘어간다)
필자가 어렸을 때엔 어디서나 국민의례는 당연한 것이었다.
매주 운동장에서 하던 아침 조회 시작은 국민의례였다. 그것도 애국가 4절까지 불렀다. 중간엔 ‘국기에 대한 맹세’도 나왔다.
반에서 학급회의를 할 때에도 국민의례부터 시작했다.
필자가 중학교 입학해서 처음 등교하는데 선배들이 정문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들어갔다. 필자도 어설프게 흉내를 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알고 보니 학교 본관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한 것이다.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국민의례를 해야 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애국가가 나오면,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예를 표해야 했다. 그 전엔 ‘대한뉴스’라는, ‘뉴스’도 아닌 대통령 주연의 정부 홍보영화을 봐야 했다. 영화 한 편 보려고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압권은 ‘국기 하강식’이었다.
오후 5시경이었나? 길을 가다 보면 어디선가의 스피커에서 ‘지금부터 국기 하강식을 거행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또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제자리에 서서 예를 표해야 했다. 일종의 ‘국민의례’였다. 이 모습을 본 한 외국인이 감동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반대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남북한이 똑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하루종일 애국가를 ‘마르고 닳도록’ 부르거나 접해야 했다.
냉전과 독재 시대에서 나온 극단적 국가주의였다.
하지만 당시엔 그게 애국이고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했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 사랑할 줄 모르는 ‘나쁜 놈’ 또는 ‘버릇없는 놈’ 취급을 했다.
문득 생각해보니 애국가를 부르거나 들어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