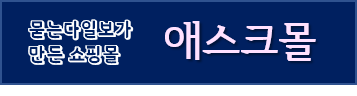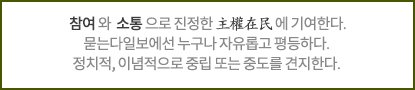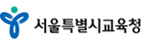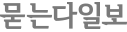배재탁칼럼 | 돈 없이도 잘 놀고 건강하고
24-02-14 13:10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6관련링크
본문
돈 없이도 잘 놀고 건강하고
얼마 전 길을 가는데 보도블럭을 공사하기 위해 한 쪽에 모래를 쌓아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 ‘예전 같으면 놀이터가 됐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어렸을 땐 장난감이란 게 참 귀했다. 특히 바퀴 달린 자동차는 부잣집 애들 아니면 만지기도 힘들었다. 좀 쉽게 구하는 장난감이라야 고작 팽이 정도였다. 구슬치기도 했지만, 구슬 역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물건이었다. 그러니 아이들은 돈이 전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 노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다.
대표적인 게 ‘모래 장난(놀이)’다.
당시엔 동네마다 공사하는 곳이 많았다. 당연히 모래를 쌓아 놓는 곳이 여기저기 생겼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알고 모여들어 모래 장난을 했다.
한 손을 손목까지 모래에 묻고, 다른 손으로 모래 위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러면서 모래에 묻혔던 손을 살살 빼면 예쁜 동굴(두껍이집)이 생겼다.
조금 더 발전해 앙쪽으로 굴을 파서 터널을 만들기도 했다. 어떤 아이는 터널 사이로 조약돌을 지나게 하면서, 자동차라고 했다. 아이들마다 굴을 파니, 여기저기 두껍이집이 만들어졌다. 어떤 아이는 그 사이를 도로(?)로 연결하기도 했다. (요즘 모래 놀이는 플라스틱 삽 등으로 구성된 세트를 가지고 한다)
여자 아이들은 옆에서 ‘모래 뺏기’ 놀이도 했다. 모래를 쌓아 놓고 가운데 막대기를 꽂은 후, 서로 번갈아 가며 모래를 가져가는 놀이다. 막대기를 쓰러트리면 진다.
모래 하나 가지고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 하루종일 놀았다.
어디나 있을 법한, 좀 넓은 터가 있을 땐 ‘자치기’를 했다.
당시엔 집집마다 크고 작은 톱이 하나쯤은 있었다. 목수나 노동자가 많았기도 했고, 집에 손 볼 일도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작대기를 하나 구해, 톱으로 적당히 자르고 좀 다듬으면 끝이다. 70~80cm 정도 되는 굵은 막대기와 10cm 정도의 가는 새끼로 구성된다. (새끼의 양 끝을 경사지게 자르는 게 포인트다)
강풍이 부는 추운 겨울에도, 손이 트도록 자치기를 했다.
적당한 돌이라도 있으면 땡큐인 놀이도 있었다.
사방치기나 비석치기(말까기)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나름 심각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그도저도 없으면 금만 그으면 되는 놀이도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게 ‘오징어게임’ 맨 앞에 나오는 ‘오징어가위상’이다. 또 금을 그을 필요도 없이, 달리기만 잘하면 되는 ‘다방구’도 있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이들은 다들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고, 체력이 좋아졌으며, 자연 면역력이 증강되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고 위생관념이 지나치면서, 아이들은 점점 장난감 없으면 못 놀고 걸핏하면 병원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자란 지금의 젊은이들은 타인과 같이 생활하고 소통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당연할 걸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