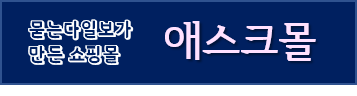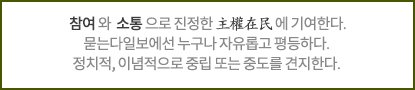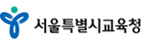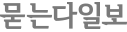배재탁칼럼 | 극장에 관한 기억
23-11-28 10:02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7관련링크
본문
극장에 관한 기억
요즘 한국영화가 위기라고 한다. 관객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OTT의 보급을 들었다. 한 달에 영화 한 편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영화나 드라마 서비스를 무한정 받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OTT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웬만한 영화가 아니면 굳이 영화관에 가서 돈을 쓸 이유가 없어졌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어릴 적 영화관에 관한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개봉관과 제2개봉관 등으로 극장이 나뉘어 있었다. 개봉관은 처음 개봉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서울에는 단성사 등의 극장이 있었다. 개봉관에서 상영을 마친 영화는 제2개봉관인 계림 아세아 극장 등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엔 성남 금성 등으로 극장으로, 그러다가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던 극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동네 극장은 대부분 썰렁했고, ‘영화도 보고 쇼도 보고’하는 극장도 있었다.
필자가 대학 다니던 시절, 개봉 영화를 보려면 주로 종로로 갔다. 그런데 대부분 매진인 경우가 많았다. “암표 있어요‘라며 가다 오는 암표 장사가 득실거렸다.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엔 암표 값도 내려갔다. 재수가 좋으면 거의 제값 주고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젊은이들은 피카디리 단성사에서 서울극장 – 명보 – 스카라 – 국도 – 대한극장까지 걸어오면서 극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그런데 개봉관에서 동네 극장까지 넘어갈수록 간판도 차이가 컸다.
당시엔 영화 간판을 일일이 그렸는데, 동네 극장에 오면 이게 그 배우가 맞는지 구분조차 안 됐다. 특히 동네 극장에선 상영 중에 필름이 끊어지기 일쑤였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필름이 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름이 끊기면 관객들은 휘파람을 불거나 야유를 보냈다. 관객들은 기사가 필름을 잘라먹는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동네 구멍가게 같은 곳엔 극장의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를 붙여주는 대가로 가게 주인에게 극장 입장권을 두 장씩 줬다. (완전 무료 입장권은 아니고 10원 정도를 내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가게 주인은 그걸 다시 팔았다.
당시 극장 중 거의 대부분은 사라졌다. 그래도 근처에 가면 한참을 줄 서서 표를 사던 기억이 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