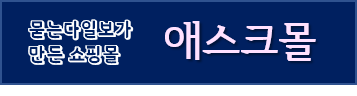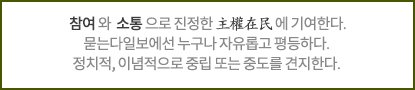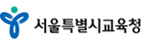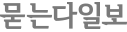배재탁칼럼 | ’공부 멋‘만 부리던 철부지 시절
22-08-03 10:10페이지 정보
좋아요 1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25관련링크
본문
’공부 멋‘만 부리던 철부지 시절
올해 수능은 11월 17일로 정해졌다.
수능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필자의 철없던 고교시절이 떠오른다.
(또 ‘라떼’ 얘기임)
필자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대로 공부를 좀 했다.
그런데 중3에 올라가며 사춘기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공부는 해야겠는데 능률이 안 올랐다. ‘공부 맛’은 못 느끼고, ‘공부 멋’만 부렸다.
당시엔 ‘밤을 잊은 그대에게’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음악방송이 인기였다. 책상머리에 라디오를 켜놓고 들으며 공부한답시고 앉아 있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잘된다’고 강변했다. 가끔은 사연(편지)이나 요청곡(엽서)를 보내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엔 엽서를 예쁘게 꾸며 보내는 게 유행이었는데, MBC에서는 매년 말 ‘예쁜 엽서 전시회’도 열었다. 필자도 한 번 가봤는데, 엽서 여러 장을 이어 붙여 ‘작품’을 만든 솜씨와 정성에 탄복했다.
한때 단과 학원 새벽반을 수강하기도 했다.
새벽 6시에 종로에 있는 학원까지 가면, 커다란 교실에 2~300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앉아 있었다. 앞에서 선생님은 녹음기처럼 중얼중얼 설명을 하는데 열정이나 감정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새벽에 나왔으니 강의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잠만 쏟아졌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면 수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여기저기 학원에서 쏟아져 나왔다. 나도 이들 중 하나라는 부뜻함을 느꼈다. 공부한 건 없지만 공부한 척은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참 한심한 짓이었다.
더욱 가관은 ‘정독도서관에서 공부하기’였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들끼리 새벽부터 정독도서관에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새벽 5시에 도착해도 대기번호표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대기를 하다보면 불과 6~7시만 되어도 입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누군지 몰라도 새벽에 와서 일찌감치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입장해서 책을 펼치면 10분도 안돼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버티다가 대개 2~3시쯤 도서관을 나섰다. ‘정독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게 성공’이란 뿌듯함만 안고서, 친구들과 놀았다.
공부를 안 하면 걱정되고, 하자니 잘 못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전형이었다.
그러니 그해 수능 결과가 좋을 리 없었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란 말처럼, 필자도 재수 학원으로 향해야 했다.
재수하는 동안 많은 반성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공부는 만회했지만, 그 재수 1년은 필자의 인생을 바꿔 놓는 아까운 한 해가 되고 말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