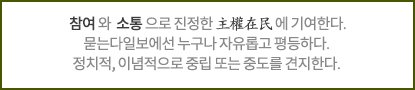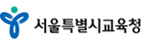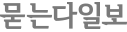배재탁칼럼 | 부채
24-08-22 10:32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36관련링크
본문
부채
장마가 끝날 무렵, 막연하게 ‘무더위가 시작된다는데 뭔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난 22일 ‘부채도사’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장두석 씨가 별세(향년 66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그때 ‘부채’를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인터넷으로 하나 구입했다. 배송비까지 18,000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품질이나 포장이 나름대로 그럴듯했다. (사진)
필자가 어렸을 때엔 선풍기도 드물어서, 여름이면 집에서 방마다 부채는 필수품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부치는 건 꽤 귀찮은 일이었다. 아무리 부쳐도 끝이 없고, 바람의 세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나 형제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로 부채 부쳐주기를 했다. 또 부모님이나 윗사람과 대화할 때 부쳐드리거나, 자식이 밥 먹을 때 부모가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기도 했다. 더운데 손님이 오시면 부채질을 해드리는 것도 예의였다.
사전을 찾아보면 ‘(바람을) 부치는 채’의 준말이 부채라고 한다. 최초의 부채는 나뭇잎이었다고 하니, 인류와 함께 할 만큼 그 역사는 너무나 오래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둥근부채(방구부채)와 접는부채(합죽선)다. 예전엔 모두 대나무 살에 종이를 붙여 만들었다.
요즘 볼 수 있는 부채는 중장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방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접이식 소형 부채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부채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채는 형태에 관계없이 대부분 크기도 작지만, 아무리 부쳐도 바람이 약하고 힘만 든다. 이런 부채는 주로 판촉물로 나눠 주는데, 바람 부치는 성능이 약해 공짜로 줘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예전의 부채는 바람이 꽤 잘 부쳐졌다. 선풍기에 익숙해진 필자가 언젠가 오랜만에 예전 방식의 부채를 부쳐보곤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생각보다 바람이 꽤 셌기 때문이었다.
요즘은 여름에 손풍기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손풍기는 얼굴에 대고 요리조리 요래요래 하는 모습이, 필자에겐 영 마뜩치 않다. 그래서 나이에 걸맞고 품격있는(?) 저렴한 합죽선을 하나 구입한 것이다.
태극문양이 그려진 둥근 부채는 인사동 같은 곳의 관광 상품 판매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합죽선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환경도 보호하고 품격도 있어보여 만족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